고정 헤더 영역
상세 컨텐츠
본문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 한반도에서 번성했던 거대한 돌무덤으로, 50톤이 넘는 덮개돌을 어떻게 옮기고 쌓았는지 불가사의합니다. 이 글에서는 고인돌의 구조와 종류, 제작 방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회적 의미를 탐구합니다. 고인돌은 단순한 무덤을 넘어 당시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고인돌의 신비로운 매력에 함께 빠져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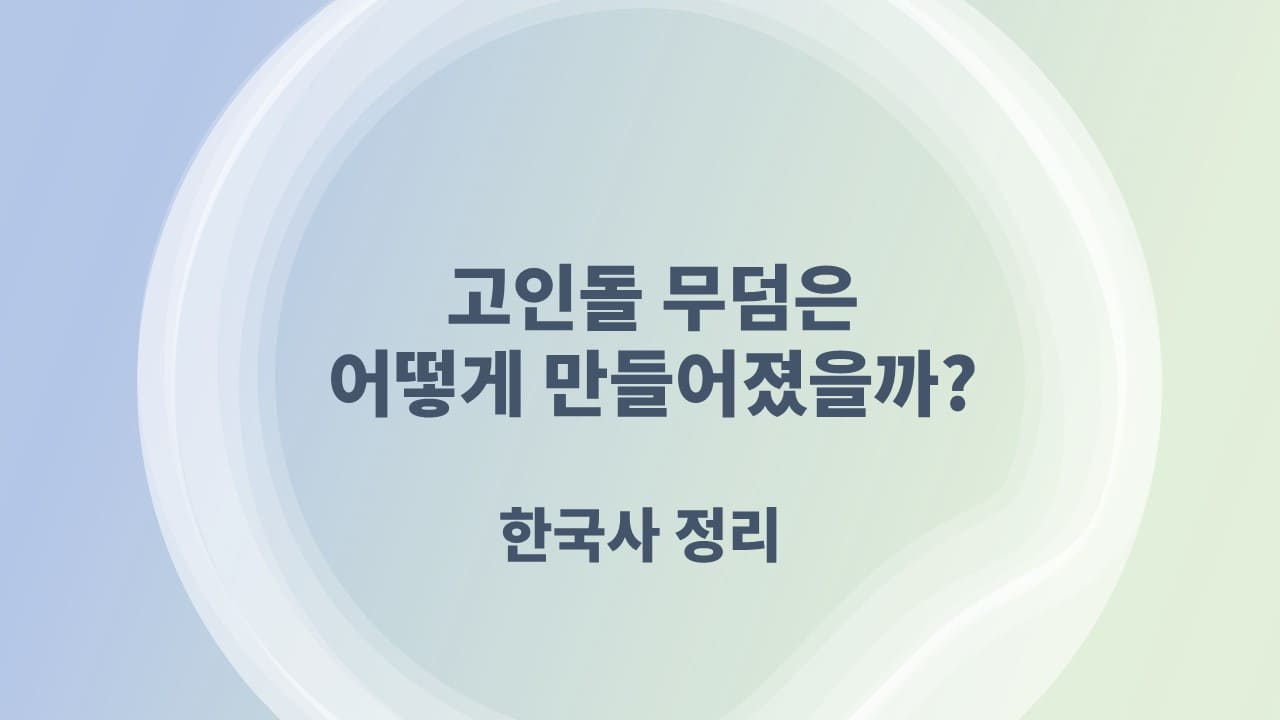
고인돌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50톤이 넘는 거대한 덮개돌을 어떻게 옮기고 조성했을까요? 고인돌 무덤은 고임돌 두 개를 적당한 간격을 두고 세운 뒤 그 위에 펑퍼짐한 덮개돌을 씌우고 아래 땅속에 시체를 안장한 것입니다. 우선 잘 쪼개지는 바위를 골라 바위 곁에 나타난 작은 틈에 징 따위로 깊은 홈을 판다. 이어 나무말뚝을 그 틈에 박고 물을 뿌려놓으면 나무가 물에 불어 팽창하면서 바위가 쩍 갈라진다. 지금도 숯막에서 큰 통나무를 쪼갤 때 이 방법을 써서 별로 힘들이지 않고 일을 해낸다.
다음은 떼어낸 돌을 운반할 차례이다. 큰 통나무를 여러 개 깔아 그 위에 옮겨온 돌을 놓고 수백 명이 달려들어 밀고 당긴다. 땅이 꽁꽁 얼어붙었을 때 밀었을 수도 있다. 돌이 밀릴 때 통나무도 같이 밀린다. 북경의 자금성은 거대한 돌로 만들었는데 먼 지역에서 석재를 운반하면서 겨울에 땅에 물을 부어 밀고 왔다고 한다. 아마 이런 방법도 썼을 것이다.
이제 운반한 돌을 고임돌 위에 올려놓는 일이 남아 있다. 먼저 고임돌을 땅에 묻어 세운다. 세워진 고임돌을 흙으로 덮고 양쪽을 약간 경사지게 만든다. 그 경사진 흙더미 위로 덮개돌을 밀어 올려놓는다. 이때에는 통나무와 판자와 밧줄을 총동원했을 것이다. 맨 마지막으로 흙을 퍼내면 제자리를 잡아 탁자 모양이 된다. 은진 관촉사의 거대한 돌부처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방법을 써서 밀어 올렸다는 전설이 있다. 고인돌 올리기의 방식은 고려 때까지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고인돌을 만드는 일은 수백 명이 동원되어야 이루어낼 수 있는 거대한 공사였다. 따라서 일에 드는 경비도 막대했다.
고인돌의 모양은 북방식과 남방식으로 나뉜다. 위에서 살펴본 거대한 탁자 모양의 덮개를 씌운 고인돌을 탁자형이라 부르는데, 주로 요동과 중부 이북 지방에 분포되어 있다. 중부 이남 지방에서는 땅속에 죽음을 안치하고 나서 작은 돌을 깔고는 덮개돌을 씌웠다. 이것을 바둑판형이라 하는데, 탁자 모양보다 힘이 훨씬 적게 든다.
북방식 가운데도 고임돌이 없는 경우가 있고 매장부가 땅 위로 올라온 경우도 있다. 남방식은 덮개가 두꺼운 것도 있고 낮은 고임돌을 사용한 경우도 있으며, 죽음은 대부분 땅 밑에 안치했다. 고인돌이 늦게 유입된 제주도에서는 무덤 한쪽만 고임돌을 받치고 한쪽은 벼랑의 바위에 기대놓은 모습도 보인다. 또 고임돌을 병풍처럼 둘러싸고 그 위에 덮개를 씌워놓기도 했다. 그러나 지역에 따른 구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지역의 특성보다는 다양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고인돌 무덤은 북쪽 시베리아 계통에서 내려온 돌널이 발전된 형태라고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 특유의 무덤 형식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고인돌 무덤은 규모 면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이것은 공동묘지의 형태처럼 수십 기가 한꺼번에 몰려 있기도 하고, 크고 작은 모습이 등급을 매긴 것처럼 다르기도 하다. 크기의 차이는 무덤을 특장과 부하, 군장과 신하로 구분한 데에서 오는 것일 터인데, 어느 씨족의 집단 묘지인 경우에는 가족 안의 서열을 따졌다. 또한 서열과는 관계없이 어린이의 경우에는 작은 고인돌 무덤을 만들었다.
고인돌 무덤의 규모만 가지고는 매장자의 신분이나 성격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우선 껴묻거리를 살펴보아야 한다. 껴묻거리는 현재까지는 주로 청동 제품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 종류는 무기와 의기가 가장 많다. 중심 무덤에서는 질이 좋은 제품이 양적으로 많이 껴묻혀 있으며 주변의 무덤에서는 조잡한 제품이 더러 나오기도 하나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순장 방법도 주인의 무덤에 무사, 시녀를 함께 묻기도 했으나 강상 무덤에서처럼 따로 주변에 묘를 만들어 중심 묘를 받드는 것처럼 위치를 잡기도 했다.

무덤들이 퍼져 있는 위치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고인돌 무덤은 주로 큰 강 유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전망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제주도에는 바다가 보이는 벼랑 끝에 자리 잡은 무덤들이 많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나 묘 자리에 경관을 따졌다는 것을 감지할 수 있다. 이는 장풍득수 풍수설의 원조라 볼 수 있다. 고인돌 무덤의 터 잡이를 보고 풍수설의 기원을 여기에 두는 견해도 있다.
고인돌 무덤은 규모로나 껴묻거리의 질과 양을 따져볼 때 귀족 계급이나 족장 이상의 신분층이 만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도 서열이 있다. 특히 껴묻거리의 무기류에서 보이는 차별이 이를 뒷받침한다.
남쪽의 고인돌 무덤은 형식이 다양하다. 북방식도 있으나 다듬지 않은 큰 돌 몇 개를 땅 위에 올려놓고 그 밑에 많은 수의 돌널을 안치해둔 집단 무덤이 수없이 많다. 집단 묘지는 지배자들의 무덤이 아니라 혈연이나 마을 공동체에서 성원들이 품앗이나 공동 출자의 형식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거대한 고인돌 무덤을 보고 이를 흉내 내서 작은 규모의 돌무덤을 집단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덤 형태는 청동기 시대 말기에 남쪽 지방에서 널리 유행되었다.
늦은 시기의 남쪽 고인돌 무덤에서도 청동기 시대 초기에 북쪽에서만 보이던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두 문화 집단이 교류하면서 뒤섞이는 모습인데 묘제에서도 이와 같은 이동과 변형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식 고인돌 무덤은 1천 년 이상의 생명력을 가지고 삼국 시대에까지 이어졌다.






댓글 영역